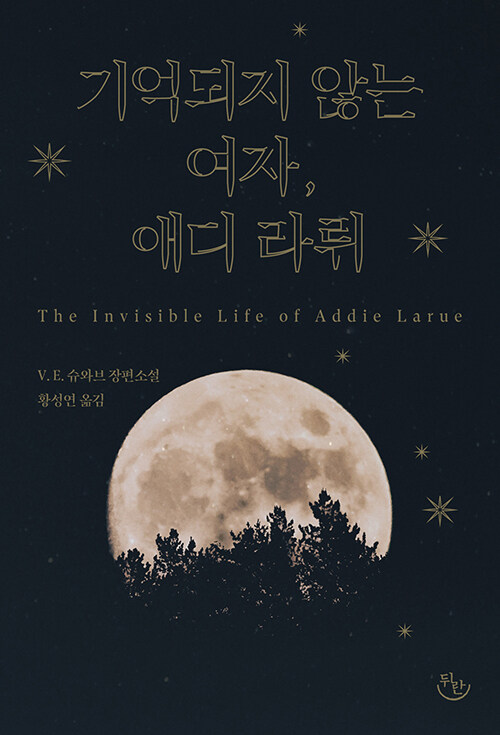
나는 영혼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을 거래로 하는 소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영혼이 뭐길래 악마는 영혼으로 거래를 하고, 인간은 그것을 저버리기 싫어할까?
그걸 이해하는 것은 나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영혼을 거래로 하는 소설을 꽤 흥미롭다.
그것을 얻거나 받기 위해 계약을 하고, 계약을 깨고 싶어하거나 바꾸고 싶어하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다분히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의 축약판 같아서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어둠은 악마는 아니다.
일단 내 생각은 그렇다.
주인공인 애디는 1700년대 초, 그 당시로는 혼기를 넘긴 여성이었다.
주변의 강요로 아이가 셋이나 있는 홀아비랑 결혼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해가 지고 난 후 어둠에게 소원을 빈다.
어둠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영혼을 달라고 하고
~~하기 싫다고 외치는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한다.
그래서 자유를 대신에 영혼을 주기로 하고, 영혼을 주는 시기는 주인공이 더 이상 희망하지 않을 때.
근데 늘 이런 계약이 있을 때마다 계약자가 꼭 지맘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래서 법이 꼼꼼하게 짜여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판례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어둠이 해석한 자유는 주인공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타인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었고,
아마 영혼을 좀 더 빨리 가져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오기가 발동한 주인공은 삼백 몇 년을 열심히 산다.
그런데 주인공을 잊지 않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어둠과 계약을 했었고 두 사람의 계약 조건이 우연찮게 들어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물론 어둠이 둘을 만나게 했으니 우연찮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요구했었어서 애디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계약조건을 바꾼다.
어둠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애디는 아마도 바뀐 계약조건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소설에서 마지막 결말은 애디가 이긴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어둠과 애디가 둘 다 이긴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어찌되었든 애디는 지치긴 했지만 본인의 영혼을 본인이 포기하면서 항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어둠은 애디를 영혼으로 보는 것보다 애디로 보는 것을 더 즐거워 한다 (아직까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둠은 인간같고 애디는 어둠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둠은 실수하고, 오래 세월을 살면서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나
애디는 사람의 눈빛, 심지어는 어둠의 눈빛을 읽고 슬쩍슬쩍 찔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 둘의 경쟁관계가 균형이 맞는 것 같다.
어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약한 인간 정도였을텐데
그것이 아니라 소설이 더 흥미로운 것 같다.
만약 내가 애디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늘 나는 주체적이라 생각해왔는데
글쎄, 요즘 생각해보면 그러진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애초에 정신과적으로 불안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어둠을 설득하다가
더 미쳐버렸을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뻔한 소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700페이지 가량을 단숨에 읽을 정도로 내 눈이 빠르지 않다는 것이 아쉬워하며 읽었다.
재미있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인한 이야기이다.
가장 인상깊은 구절은 Aut viam inveniam aut faciam (길을 찾거나, 만들거나)이었다.
나도 그래야 할텐데.
난 늘 찾으려고만 하는데
찾아도 없다면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